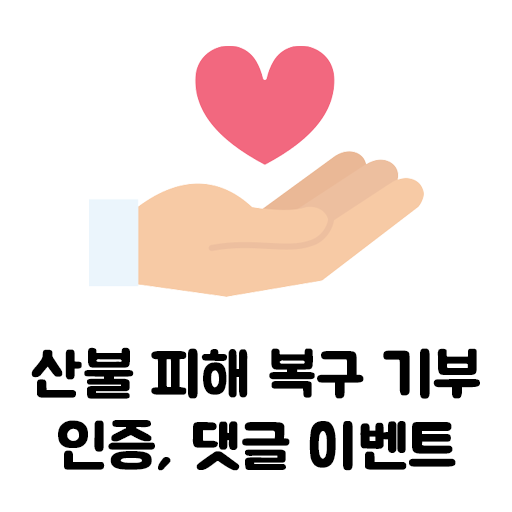이전 게시글(
https://pgr21.com./freedom/103979)에서 이어집니다.
7. 괘씸했다
자폐를 개선시킨다는 그 약의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그 의사에 대한 악감정이 없지 않았다. 되돌아보면 상술 가득했던 그 상담 세션 때문인데, 당시 그가 우리 아이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 동원한 표현 하나가 뽑지 못한 가시처럼 내 마음에 쿡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당시 자폐니 장애니 하는 것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고, 아무런 감각도 갖추지 못한 나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라고 물었다. 그 때 그는 아이 눈을 한 번 보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보세요. 거의 개나 고양이 수준이잖아요. 많이 심각한 거지.”
“개나 고양이요? 그래도 한 번씩 주변을 쳐다 보잖아요?”
(자폐의 특성 중 하나가 눈 맞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도 그랬다.)
“먹을 거 줄 때나 그렇죠. 먹을 거 달라는 거죠. 그게 개나 고양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비고 들어오던 그 순간에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가슴이 서서히 답답해져 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짐승에 비교하다니... 그 말 취소하라고 일갈도 하지 못한 내가 무슨 애비냐. 가슴을 턱턱 치면서 고속도로를 내달렸다. 그 때 생긴 분과 자책을 훗날 아내에게 실토하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 마음을 설명하려면 내 자식을 짐승에 비유한 그 말을 내 입으로 직접 뱉어야 했기 때문이다.
약을 꼼꼼하게 먹이고, 또 그 약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키토 식단을 아내가 자신의 건강과 바꿔가며 유지하는데도 못본 척 한 데에는 그러한 원한 비슷한 감정이 적잖이 작용했다. ‘어디 두고 보자,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라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약만 잘 들으면 그 따위 말도 용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의 표현을 곱씹게 됐고 미움은 깊어져만 갔다. 그게 너무 괴로웠다.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용서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약효였다.
혼자 속좁게 끙끙 앓는 동안 아내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내에게도 그 의사는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한 존재였다.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약효가 떨어지면 대뜸 달려가 그 의사놈 사무실을 뒤엎으려 하는 나와 달리, 아내는 이왕 시작한 것, 약효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건 대부분의 자폐 및 장애 아동 가정에서 실시하는 ‘재활 훈련’이었다.
우리가 먹이고 있던 약은 ‘뇌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재활 훈련을 우습게 여겼다. 뇌의 기능이 비정상인데, 사지 움직이는 훈련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다. 그는 재활 훈련사들을 두고 ‘돈만 받아처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말했었다. 효과도 없는데 부모들 희망 고문만 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만 자기 약을 먹이면서 하는 재활 훈련은 괜찮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도 병원 한쪽에는 재활 치료를 실시하고 있었다.
재활 병원들의 이론은 그와 정반대였다. 뇌가 신호를 줘서 몸이 움직이는 게 맞지만, 반대로 몸이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의 근육이 발달해야 엎드리고, 앉고, 설 수 있고, 그렇게 눈 높이와 활동 범위가 차근차근 달라지면서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이 다양해져 뇌가 자극을 받는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럴 듯했다. 마음이 동해야 움직여지는 게 사람이라지만, 반대로 억지로 몸부터 움직여 봤더니 나중에 마음이 뒤따라오는 경우를 살면서 적잖게 경험해 보지 않는가.
아내는 이것 저것 재지 않았다. 뇌부터 깨워야 한다는 이론과, 근육부터 깨워야 한다는 이론을 통합하면 그만이라는 게 아내의 결론이었다. 뇌부터 깨우는 약을 먹이고 있으니, 이제 근육을 깨우는 훈련 센터만 찾으면 없던 약효도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난 반대했다. 일단 그 의사놈에게 갚아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걸 끊고 그의 이론과 약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먼저 두고봐야 했다. 다만 내 이런 계획을 아내에게 곧이 곧대로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저 “약효가 있는지부터 봐야 다음 달에도 약을 더 먹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아내는 무슨 자신감인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약을 더 먹을지 끊을지 알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살리는 중이야”라고 일침했다.
머지 않아 아내는 동네 재활 센터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나는 장거리 운전 기사 역할을 해야 했다. 운전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하는 나의 습성이라는 것은 잊힌 지 오래였다. 그러면서 그 의사에 대한 미움도 서서히 흐려졌다. 재활 센터들의 상담을 받아보니 그를 미워하기에는, 내 아이의 골든타임이 너무 촉박했다.